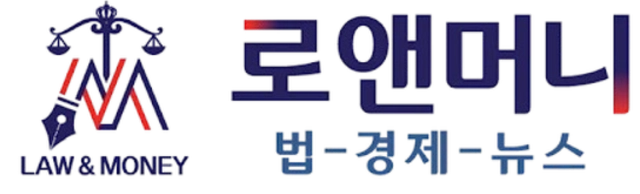법원 "사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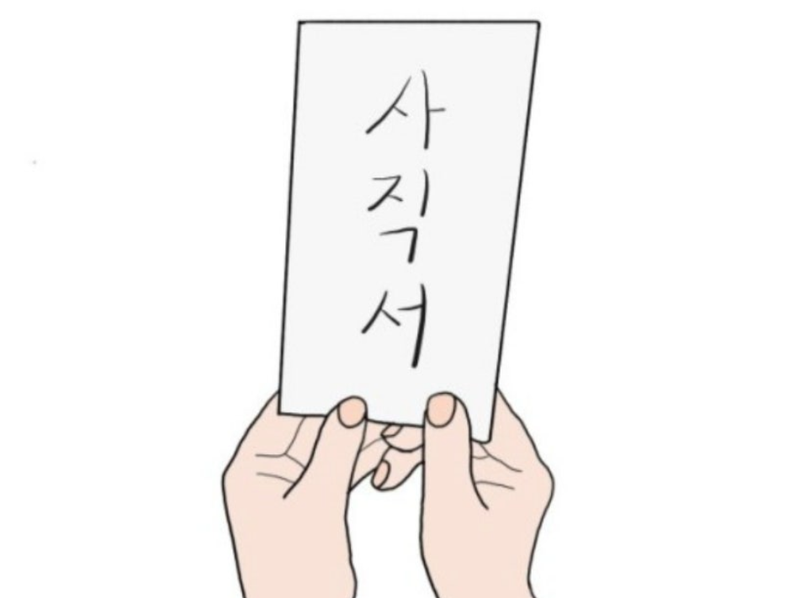
"잠시 정신이 나갔다고요? 당신이 회사에 낸 사직서, 회사가 수리하면 끝입니다. 사표 함부로 내지 마세요"
이런 내용의 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직서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신적 압박 상태에서 작성한 사직서라도,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9월 11일 모협동조합 직원이었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강재원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사건번호는 2024구합90849이다.
A씨는 2024년 1월 다른 지점으로 전보 발령을 받은 후 건강상의 이유로 휴가를 사용했다가 2월 13일 복귀했다. 그러나 그는 출근한 지 불과 20분 만에 개인사정을 이유로 자필 사직서를 제출했고, 협동조합은 당일 이를 즉시 수리했다.
이후 A씨는 조합장의 괴롭힘과 전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압박이 극심한 상태에서 제출한 비진의 의사표시(非眞意 意思表示·내심의 의사와 실제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민법 개념)이므로 사직서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는 이것이 "사실상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직 의사가 철회되어 효력이 없는지, 그리고 사직 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먼저 재판부는 2024년 2월 13일 제출된 사직서가 당일 즉시 수리되었으므로 회사의 동의 없이는 사직을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면 낸 사람이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A씨가 점심 무렵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사 담당자와의 통화나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 등에서 원고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는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직 의사에 대한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직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A씨가 제출한 응급실 진료 기록 및 정신과 진단 기록은 있었으나, 사직서 작성 시점에 판단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직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법원은 "순간의 감정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직서는 그저 안주머니에 항상 갖고 있는 종이 한 장이 아니다. 일단 회사에 내면 노동계약 관계를 스스로 종료시키는 강력한 법적 행위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