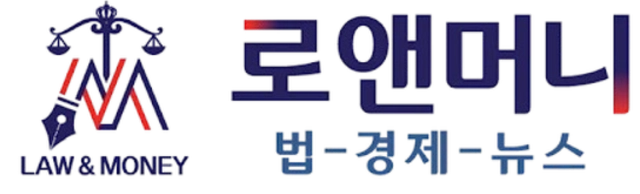왜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손해를 배상했나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적연금 기금이다. 대다수 국민들 노후를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자 국가 재정의 한 축이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한때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던 지금의 한화오션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분식회계로 손실을 숨기는 회계조작이 있었고, 결국 대법원은 한화오션이 국민연금에 44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뿌리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대규모로 매입했다. 당시 공시된 재무제표와 회계자료를 근거로 한 투자였다. 그러나 뒤늦게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숨겼고, 감사원 조사 결과 2년 동안 1.5조 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공시는 투자자들을 속였고, 국민연금은 채권을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매입하게 되었다.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적 기금이 회계조작 기업의 희생양이 된 셈이다.
국민연금은 즉시 소송으로 대응했다. "분식회계로 인해 정상가치보다 과도하게 비싼 값에 채권을 산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였다. 1심 법원은 국민연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으나, 이후 회사가 신규 자금 지원을 받아 변제 능력을 회복했고 채권이 상환된 점을 참작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채권자집회 결의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여부, 손해액 산정 방식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특히 항소심은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두 재판부가 공동 심리를 진행한 이례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증권사와 은행까지 함께 소송을 제기했을 정도로 피해 규모와 파장이 컸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의 손을 들어줬다. 허위 기재된 회계자료로 채권을 매입했다면 손해는 '매입 시점'에 이미 발생한 것이며, 이후 변제나 이자수령은 손해를 줄이는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즉, 분식회계라는 범죄 행위로 인해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을 빼앗겼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화오션의 잘못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은 없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꼼꼼히 살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허위 공시를 걸러내지 못하고 거액의 투자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운용 주체로서의 감시·감독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 결과에만 의존하고, 내부 위험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국민연금이 피해자임과 동시에 더 적극적인 위험 감시를 하지 못한 관리 실패의 책임도 일부 안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사건은 기업 범죄 행위가 국민의 노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는 기금이다. 회사 하나의 분식회계가 수백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13~2016년 대우조선에 1조5542억 원을 투자해 2412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주식·채권 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로 활동하는 만큼, 허위 회계로 인한 손실은 곧 국민 보험료의 낭비이자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